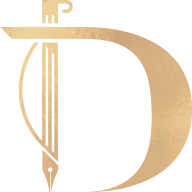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협박죄#온라인 커뮤니티#개인적 감정 표현#형사사건#공소기각
도아에 이르기까지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협박죄 구성요건 분석. 형법상 협박죄의 핵심인 '해악고지'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온라인 게시글이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한 감정 표현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 제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개인적 감정 토로가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형사처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성 부족.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서 특정성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막연한 혐의로는 형사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대상의 불명확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협박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피해자 없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의 온라인 표현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협박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특수성과 맥락을 종합 고려하여, 이것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리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소 기각
법무법인 도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아가 제시한 법리와 논증을 받아들여 검찰의 공소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도아만의 법리 분석과 변론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적인 감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표현할 경우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심각한 범죄 혐의에 휘말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문적인 형사변론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웠을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최지양
파트너변호사
금융·블록체인, 상속·이혼·후견, 민사·부동산
임동규
파트너변호사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오수비
파트너변호사
금융·블록체인, 기업법무·조세, 의료·행정
홍정민
대표변호사
자본시장·기업금융, AI·4차 산업 규제 대응, 정책·입법자문
다음글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2025년 O월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까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전력과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누범으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2025-10-28
도아 상담 신청
지금 도아의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하기